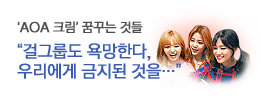[단독]평균연봉 9700만원 노조, 92일 ‘정치파업’의 끝은?
유성열기자
입력 2016-03-30 03:00:00 수정 2016-03-30 10:29:17
1973년 설립돼 우레탄 원료를 생산하는 KPX케미칼㈜은 석유화학업계의 알짜 회사로 꼽힌다. 근로자 수는 239명밖에 되지 않지만 2014년부터 2년간 매출액이 매년 6000억 원을 넘었다. 국내외 계열사만 27곳에 달하고, 공장도 울산과 충남 천안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생산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9700만 원(2014년 기준)으로 울산석유화학단지 15개 업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계 호황을 타고 매년 3∼5%씩 임금을 인상한 결과다. 1988년 설립된 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화학노련 소속이지만 16년 동안 단 한 건의 분규도 일으키지 않았다.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노사가 ‘윈윈’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노사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했다. 유가 하락과 국내 경기 침체 등 대내외 환경이 나빠지면서 2014년 6919억 원이던 매출액은 지난해 6077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사측은 경영 악화에 대비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호봉제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신입사원 초임 10% 삭감 △기본급 동결 등을 제안했다. 만약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일부 공정의 외주화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오히려 기본급 5.1% 인상, 성과급 450%와 타결금 200만 원 지급 등을 요구했다. 2014년에도 33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는 게 근거였다. 특히 호봉제 폐지와 일부 공정 외주화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임금피크제는 올해 예정된 단협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신입사원 초임 삭감은 검토해 보자고 대응했다.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9차례의 교섭이 모두 결렬되자 노조는 투표를 거쳐 11월 30일 파업(찬성 86.8%)을 결의했다. 여기까지는 근로조건을 둘러싼 전형적인 노사 갈등이었다. 노사가 시간을 두고 충분히 대화하면 실제 파업 없이 합의도 가능했다.
그러나 노조 지도부는 12월 10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이때부터 한국노총의 개입이 시작됐다. 지도부는 조합원 이탈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을 한국노총 여주교육원에 모아놓고 농성을 시작했고,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에 투쟁본부를 마련했다. 12월 17일 집회에는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 등 상급단체 간부들이 참석해 “단위사업장 투쟁을 넘어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에 맞서는 투쟁”이라고 규정했다. 당시는 한국노총이 2대 지침 등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으며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공론화할 때다. KPX케미칼 노조 파업이 노동개혁 투쟁의 상징이 되면서 사실상 ‘정치파업’으로 변질된 것이다. 실제로 애초부터 대타협을 반대했던 화학노련은 한국노총이 올해 1월 19일 대타협을 파기할 때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사측은 원칙적 대응을 준수했다. 장기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관철하고, 경영여건을 개선하려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뜻도 굽히지 않았다. 노조가 제시한 두 차례의 수정안도 사측은 모두 거부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파업기간 중 노사교섭을 5차례 주선하면서 대화를 통한 합의를 유도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울산 지역 여론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노조는 애초 검토해 보자던 신입사원 초임 삭감도 수용 불가로 입장을 바꿨다. 연봉 1억 원의 ‘귀족 노조’가 기득권만 지키려 한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노조 지도부는 여주교육원에서 농성을 벌이던 조합원들을 지난달 20일 울산으로 복귀시켰고, 이달 8일에는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사측은 “진정한 복귀 의사로 볼 수 없다”며 9일 직장폐쇄까지 단행했다. 결국 노조는 15일 업무에 복귀했고, 직장폐쇄 해제를 거쳐 23일 임금체계 개편과 신입사원 초임 삭감 등 사측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된 최종안에 사인했다. 조직의 운명을 걸었던 92일간의 파업이 아무 소득 없이 끝난 것이다.
특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관철되면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89명은 92일간 임금 2100만 원(평균)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정치파업을 진행한 노조 지도부에 대한 불신까지 팽배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급단체의 개입이 노골화된 정치파업으로 회사와 근로자들만 피해를 본 대표적 사례”라며 “정치파업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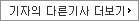


생산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9700만 원(2014년 기준)으로 울산석유화학단지 15개 업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계 호황을 타고 매년 3∼5%씩 임금을 인상한 결과다. 1988년 설립된 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화학노련 소속이지만 16년 동안 단 한 건의 분규도 일으키지 않았다.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노사가 ‘윈윈’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노사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했다. 유가 하락과 국내 경기 침체 등 대내외 환경이 나빠지면서 2014년 6919억 원이던 매출액은 지난해 6077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사측은 경영 악화에 대비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호봉제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신입사원 초임 10% 삭감 △기본급 동결 등을 제안했다. 만약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일부 공정의 외주화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오히려 기본급 5.1% 인상, 성과급 450%와 타결금 200만 원 지급 등을 요구했다. 2014년에도 33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는 게 근거였다. 특히 호봉제 폐지와 일부 공정 외주화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임금피크제는 올해 예정된 단협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신입사원 초임 삭감은 검토해 보자고 대응했다.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9차례의 교섭이 모두 결렬되자 노조는 투표를 거쳐 11월 30일 파업(찬성 86.8%)을 결의했다. 여기까지는 근로조건을 둘러싼 전형적인 노사 갈등이었다. 노사가 시간을 두고 충분히 대화하면 실제 파업 없이 합의도 가능했다.
사측은 원칙적 대응을 준수했다. 장기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관철하고, 경영여건을 개선하려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뜻도 굽히지 않았다. 노조가 제시한 두 차례의 수정안도 사측은 모두 거부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파업기간 중 노사교섭을 5차례 주선하면서 대화를 통한 합의를 유도했다.
특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관철되면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89명은 92일간 임금 2100만 원(평균)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정치파업을 진행한 노조 지도부에 대한 불신까지 팽배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급단체의 개입이 노골화된 정치파업으로 회사와 근로자들만 피해를 본 대표적 사례”라며 “정치파업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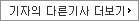


'살면서-받은 메일과 신문 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민의당, 권은희 포스터 논란 사과..."부적절한 행위"-동아일보 (0) | 2016.04.04 |
|---|---|
| 돈키호테 주진형의 막말-동아일보 홍수용 논설위원 (0) | 2016.04.01 |
| '크림빵 뺑소니범'음주운전 결국 무죄--동아일보 (0) | 2016.03.25 |
| 전교조 "세월호 규명-국정화 저지"...총선-대선 이슈화 노려--동아일보 (0) | 2016.03.25 |
| 초등생에 세월호 진실 알린다는 전교조 '4.16교과서---동아일보 (0) | 2016.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