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칼럼] 문재인의 워싱턴, 지독한 역설의 장면
노무현의 통상 외교 승리
트럼프가 공인 해줬다
‘한·미 FTA는 매국’ 이라던
그들, 이제는 반성문 써야
민주당 반대의 장진호 기념비
문재인의 언어로 빛났다

박보균 칼럼니스트·대기자
새로운 반전은 결정적이었다. 문재인·트럼프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그 장면이 펼쳐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는 미국엔 거친 협정(rough deal)이었다”고 했다. 그는 협정을 뒤틀려고 작심한 듯했다. 트럼프의 불만 표출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다. 그는 “우리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job-killing), 재앙(disaster), 끔찍한(horrible) 협상”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방어에 나섰다. “한·미 FTA는 미국에도 이익이고, 재협상은 없다”고 했다. 반전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노무현의 성취는 트럼프의 직설로 확인됐다. 트럼프가 노무현의 외교 승리를 공인한 것이다. 그것은 지독한 역설의 풍경이다.
한·미 FTA를 상처 냈던 그들의 감회는 무엇일까. 그 세력은 한국 경제의 미국 종속을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인들의 FTA 공략은 탁월했다. 노무현의 예언대로 성공 승부수였다. 이제는 친노 사람만이라도 반성문을 써야 한다. 하지만 그들 다수는 침묵한다. 과거 자신들의 무지와 무모함, 국력 낭비의 실책을 숨기려 한다. 그 세력의 상당수는 집권 민주당에 있다. 그리고 문재인 권력 속에 진입해 있다.
문 대통령의 워싱턴 데뷔는 강렬했다. 그의 장진호(長津湖) 기념비 방문 모습은 압권이다. 기념비는 미 해병대 박물관(버지니아주 콴티코)에 있다. 그의 연설은 미국인들에게 감동으로 꽂혔다. “장진호 용사들이 없었다면, 흥남철수 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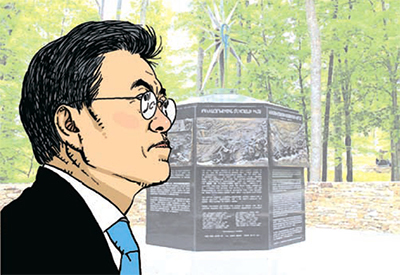
장진호 기념비의 건립 주역은 보훈처장 때의 박승춘이다. 기념비 지원 예산은 곡절을 겪었다. 2014년 예산안(3억원)이 국회 정무위에서 삭감됐다. 박승춘은 정우택 정무위원장실로 달려갔다. 그는 서류를 집어던지며 항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그를 혼냈다. “국회를 무시한다”는 질타였다. 삭감은 야당(지금은 민주당)이 주도했다. 여당(당시 새누리당)은 게을렀다. 한·미 동맹의 상징물 보호에 망설였다. 웰빙 보수는 가치 투쟁에 비겁하다. 5월 4일 기념비 준공·제막식이 있었다. 그 직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 박승춘은 경질됐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반대 때문이었다. 박승춘의 집념은 문재인의 외교 무대를 빛내줬다. 미묘한 역설이다.
트럼프는 비공개 집무실을 문 대통령에게 보여줬다. 백악관 3층의 트리티(Treaty) 룸이다. 그것은 파격적 환대로 소개됐다. 1898년 8월 그곳에서 미국·스페인의 평화협정 서명식이 있었다. 서명식을 묘사한 그림이 걸려 있다. 그 그림이 트리티 룸을 압도한다. 전쟁의 배경에 미국 전함 메인호 침몰 사건이 있다. 사건은 미 해군의 조작 논란에 장기간 휩싸였다. 하지만 그 그림은 퇴출되지 않는다. 트리티 룸은 1960년대 초 케네디 대통령 시절 재단장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역사의 연속성과 역동성을 중시한다.
역사는 직진만 하지 않는다. 역설의 파란 앞에선 우회한다. 유능한 지도자는 역설을 낚아채고 활용한다. 그 역량은 역사의 균형감각에서 나온다. 공과(功過)를 다루는 기량이 필요하다. 리더십은 과거를 탐색, 분류한다. 공적을 온고지신으로 삼는다. 과오는 반면교사다. 미국의 대통령 문화는 그런 지혜에 익숙하다.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은 역사 통찰의 모범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도 그런 역사의식에 충실하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전체를 성찰하며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역사의 균형감각은 그 결실을 보장한다.
박보균 칼럼니스트·대기자
[출처: 중앙일보] [박보균 칼럼] 문재인의 워싱턴, 지독한 역설의 장면
'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정재의 시시각각] 원전 공론조사 하자,제대로 (0) | 2017.07.07 |
|---|---|
| "한반도 전쟁 시 첫날 北 자주포.방사포 공격에 최대 6만명 사망"...NYT, '한반도 전쟁 가상 시나리오 (0) | 2017.07.07 |
| 北, 장웅 IOC 위원 "스포츠로 남북관계 물꼬? 천진난만한 생각" (0) | 2017.07.04 |
| FTA 검투사 김종훈,"문재인에게 묻고 싶다.똑같은 FTA인데 그 땐 왜 반대하고,지금은 ... (0) | 2017.07.04 |
| 제2연평해전 15주년...총리도 보훈처장도 없었다 (0) | 2017.07.01 |